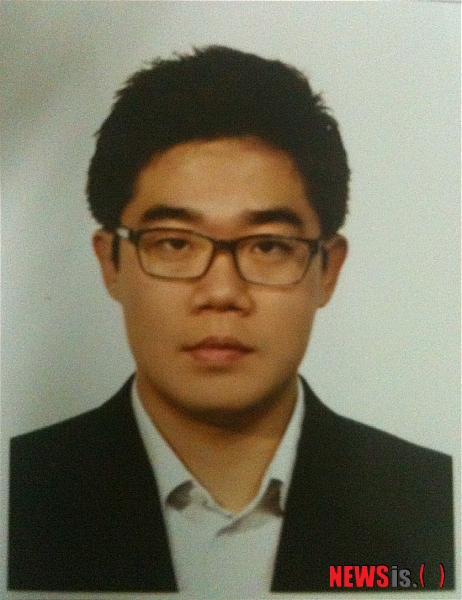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은 꼴도 보기 싫어서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고 했더니 블랙컨슈머로 의심하네요.' '제품 교환이 회사 규정인데 현금을 요구하니 난감합니다."
식료품 이물질 보상규정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건강을 위협받았으니 정식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며 핏대를 세우고, 기업은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권으로 소비자를 달래려 하니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은 새제품으로 맞교환 해주는 것이다.
제 값을 주고 산 먹거리에서 끔찍한 벌레가 나왔다면 소비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분노는 두배 세배로 커질 것이다.
이런 기분의 소비자에게 '새 제품 교환'이라는 원칙만 내세운다면 그 다음 장면은 불보듯 훤하다.
분쟁해결 기준만 있을 뿐 명확한 보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기업들도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
현금보상은 선례를 남길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품교환 또는 상품권 등으로 소비자를 달래고 있지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원하는 소비자와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소비자가 받는 보상 정도도 제각각이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식음료제품 하자에 대한 기업의 보상 방식은 동일제품의 1~20배 교환(28.3%), 제품값 보상(23.6%), 상품권(11.8%), 동일제품+다른제품(7.9%), 다른제품+현금보상(1.6%) 등으로 천차만별이었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비자마다 보상규모가 이처럼 다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얘기가 상식처럼 통용된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공유하는 정보들로 넘쳐난다.
최근 소비자와 기업간 이물질 분쟁 과정에서는 블랙컨슈머 논란도 빠지지 않는다.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는 현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와 악의적으로 접근한 '블랙컨슈머'의 경계도 모호해지는 셈이다.
즉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상 기준이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블랙컨슈머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규제의 틀 안에 어떻게 담을지가 큰 숙제'라는 말로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하루빨리 기업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과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